예산이 없어 힘든 마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ㅣ마케터(디렉터) 초인
예산이 없어 힘든 마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ㅣ마케터(디렉터) 초인
일자
상시
유형
아티클태그
이 아티클은 <스타트업 마린이 고민 무물> 시리즈의 3화입니다.
초인 : *마린아, 잘 지냈어? 요즘은 좀 어때?
*마린이 : 마케터와 어린이를 합성한 말로, 주니어 마케터를 귀엽게 부르는 말
마린이 : 지난번에 이야기해 준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어! 퇴사를 고민하다가 일단 남아서 배워가야 할 게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목표를 위해 남아서 다시 열심히 달리는 중이야. (#1 퇴사 편 링크) 그리고 다른 부서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나아질 수 있었어. (#2 소통 편 링크)
초인 : 다행이네. 남아야 할 이유도 찾았고, 일하는 과정도 나아진 것 같고. 그럼 이제 고민 끝?
마린이 : 사실…. 말 못 할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성과를 바로 내야 하는데, 예산을 주지 않아.
초인 : 혹시 필요하다고 요청해 봤어?
마린이 :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왜 필요한지 어떤 결과를 보여줄 것인지를 이야기해달래. 그런데 해보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어려워. 경험이 없으니까. 결국 비용 없이 하게 되고, 성과는 작고. 그게 고민이야! 나도 많은 예산으로 일하고 싶어. 마케터는 다 이런 걸까?
초인 : 예산 없이 성과 내야하는 과정이 어려운 거구나. 나도 놀랍게도 같은 고민을 많이 했었어. 심지어 대기업의 마케터로 있을 때, 한 브랜드의 총괄을 할 때도. 매 순간에.
마린이 : 진짜..? 대기업도? 총괄일 때도 그랬다고?
초인 : 응. 신기하게도 예산이 풍족하다고 만족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바라보고 나서, 일이 더 쉽게 풀린 경험은 있어. 도움 될 이야기 꺼내줄까?
마린이 : 응!
1. 예산의 비밀, 나도 예산이라고?
마케터에게 ‘돈, 예산’이란 어떤 의미일까?
마케터에게는 총알과도 같아. 왜일까? 기본적으로 마케팅이란 돈을 써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지. 성과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총알)을 잘 써야 해. 예산이 없다고? 지금 일하는 마케터들 인건비, 사무실 비용, 4대 보험까지 모든 것이 결국 회사에서는 비용에 포함돼.
마케터는 항상 자신이 받는 비용보다 더 많은 매출 혹은 부가 가치를 만들어야 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300만 원 이상으로 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보다 최소 4배는 더 벌어야만 회사 입장에서 고용 효율성이 생길 수 있어. 이미 안정화 된 사업이나 성장하는 브랜드 경우에는 기존 수치를 계속해서 더 성장시켜야 하지.
초인 : *마린아, 잘 지냈어? 요즘은 좀 어때?
*마린이 : 마케터와 어린이를 합성한 말로, 주니어 마케터를 귀엽게 부르는 말
마린이 : 지난번에 이야기해 준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어! 퇴사를 고민하다가 일단 남아서 배워가야 할 게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목표를 위해 남아서 다시 열심히 달리는 중이야. (#1 퇴사 편 링크) 그리고 다른 부서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나아질 수 있었어. (#2 소통 편 링크)
초인 : 다행이네. 남아야 할 이유도 찾았고, 일하는 과정도 나아진 것 같고. 그럼 이제 고민 끝?
마린이 : 사실…. 말 못 할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성과를 바로 내야 하는데, 예산을 주지 않아.
초인 : 혹시 필요하다고 요청해 봤어?
마린이 :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왜 필요한지 어떤 결과를 보여줄 것인지를 이야기해달래. 그런데 해보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어려워. 경험이 없으니까. 결국 비용 없이 하게 되고, 성과는 작고. 그게 고민이야! 나도 많은 예산으로 일하고 싶어. 마케터는 다 이런 걸까?
초인 : 예산 없이 성과 내야하는 과정이 어려운 거구나. 나도 놀랍게도 같은 고민을 많이 했었어. 심지어 대기업의 마케터로 있을 때, 한 브랜드의 총괄을 할 때도. 매 순간에.
마린이 : 진짜..? 대기업도? 총괄일 때도 그랬다고?
초인 : 응. 신기하게도 예산이 풍족하다고 만족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바라보고 나서, 일이 더 쉽게 풀린 경험은 있어. 도움 될 이야기 꺼내줄까?
마린이 : 응!
1. 예산의 비밀, 나도 예산이라고?
마케터에게 ‘돈, 예산’이란 어떤 의미일까?
마케터에게는 총알과도 같아. 왜일까? 기본적으로 마케팅이란 돈을 써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지. 성과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총알)을 잘 써야 해. 예산이 없다고? 지금 일하는 마케터들 인건비, 사무실 비용, 4대 보험까지 모든 것이 결국 회사에서는 비용에 포함돼.
마케터는 항상 자신이 받는 비용보다 더 많은 매출 혹은 부가 가치를 만들어야 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300만 원 이상으로 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보다 최소 4배는 더 벌어야만 회사 입장에서 고용 효율성이 생길 수 있어. 이미 안정화 된 사업이나 성장하는 브랜드 경우에는 기존 수치를 계속해서 더 성장시켜야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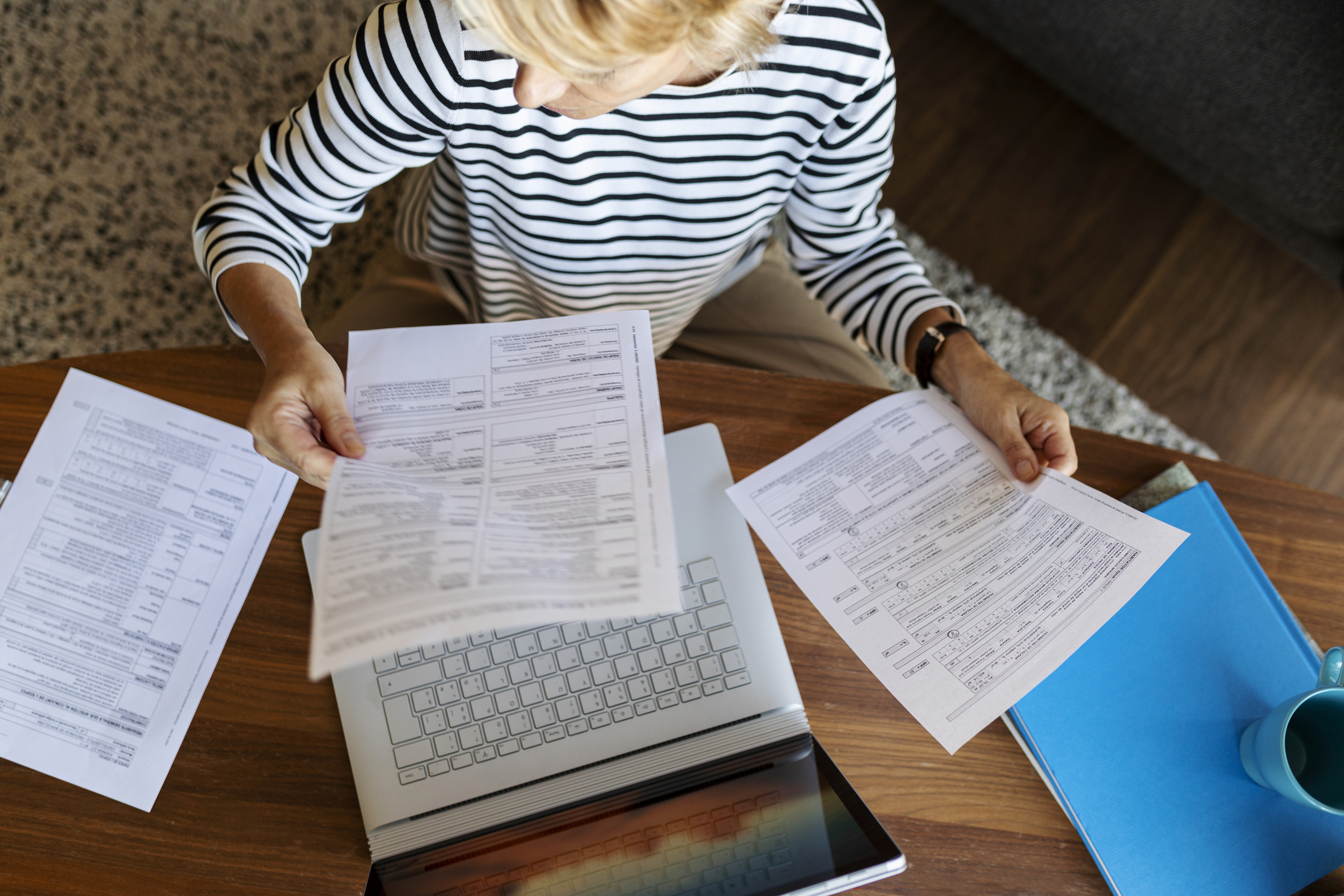
📍 먼저 마케터부터 예산에 포함된다.
회사는 언제나 사람을 더 뽑으면 좋을지, 외주로 쓸지 고민하고 있어.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회사 선택은 고용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0원이라는 생각은 경영진 입장에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아.
📍 내가 일하는 ‘시간’이 예산이다! 내 시간은 ‘가치’를 만들고 있을까? 이걸 항상 생각해.
2. 예산의 함정. 예산은 득일까, 독일까?
자, 그럼 이제 실제 예산을 받게 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1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어. 그걸로 100만 원을 더 벌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일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케터와 협업하는 직원의 시간까지 인건비로 환산하면 결국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야. 그럼 얼마 정도가 좋을까?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3배는 되어야 해. 가장 좋은 건 5배, 10배 그 이상이겠지만. 그럴 자신이 없다고? 그럼 일단 예산 없이 작은 성과를 만들어내.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설득하는 거지. 지금 만든 이 성과의 예산을 넣으면 N배 이상 더 거둘 수 있다고. 이미 만든 작은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설득에 힘을 더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게 했던 말을 기억해? '다른 곳들도 다 이런 걸까?'라는 말.
물론 10억, 50억 예산을 사용하는 곳도 있어. 그런데 이걸 기억해. 그곳은 그만큼 높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아마도 수십억 혹은 수백억이겠지? 예산 크기는 결국 목표 크기와도 비례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아.
📍 예산을 쓰면 그보다 최소 배 이상은 더 벌어야 한다.
회사는 언제나 인풋 대비 아웃풋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예산을 쓴다는 것은 그보다 배 이상 높은 효과를 기대한다는 의미지.
그 이상으로 결과를 만들 자신이 없다고? 그럼 예산 없는 성과를 먼저 만들어봐. 그걸 토대로 스스로 검증하고 어느 정도 예측이 될 때 예산을 쓰는 방법을 시도해 보면 좋아. 아무런 예측 근거가 없다면, 무작정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 내가 ‘예산’을 쓰면 그걸로 ‘얼마’를 더 벌 수 있을까? 이걸 항상 생각해.
3. 예산의 쓸모. 예산에 이런 장치가?
자, 그럼 이제 내 시간이라는 예산을 써서 작은 실험을 통해 작은 결과물을 만들었어. 이제 더 큰 성과의 예측 가능성도 생겼어. 그래서 예산을 요청하려고 해. 그런데 기대되는 결과물이 실제 돈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지? 콘텐츠 마케팅을 하고 있어서 SNS 채널이 더 커지고, 콘텐츠가 더 확산이 되는 건데! 이건 돈이 아니니까 예산을 요청할 수 없는 걸까?
📍 예산으로 어떤 ‘성과’를 만들지 ‘숫자’로 표현되어야 해.
꼭 매출만이 성과는 아니야. 콘텐츠 마케터는 채널의 성장과 콘텐츠 확산이, CRM 마케터는 재구매율과 지속적인 유입이, 브랜드 마케터는 브랜드의 인지와 호감도도 충분히 성과가 될 수 있어. 우리가 예산으로 만드는 것들이 전부 이런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지.
만약 바로 매출로 환산이 되지 않는다? 그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기준표를 만들어봐. 만약 콘텐츠 마케터라면 우리 채널의 팔로워 수 1명당 00원, 좋아요 1개당 00원의 가치로. 물론 어떤 국가 공인, 글로벌 표준으로 딱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기 쉽지 않아. 그렇다고 부르는 게 고스란히 값이 될 수는 없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지난번 행사에서 1500원 상당의 선물 주면서 1명의 구독자를 모았어요. 15만 원으로 100명을 더 모았죠. 그런데 50명이 이탈해서, 결과적으로 15만 원으로 50명이 남아 결국 인당 3천 원의 비용이 들었어요. 이번 프로모션에 50만 원의 예산을 주시면, 제가 500명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럼 인당 단가 1천 원으로 기존의 3분의 1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오프라인 프로모션
15만 원으로 50명 확보 = 인당 3천 원 (기준 근거)
신규 온라인 프로모션
50만 원으로 500명 확보 = 인당 1천 원 (예산 타당성)
예를 든 것이지만, 이벤트 참여수 / 오프라인 방문객수 / 영상 조회수 등 기존 사례를 기반으로 예산 대비 성과를 숫자로 만들어볼 수 있어. 그걸 기준으로 설득을 하면 예산을 얻는 과정에서 좀 더 수월할 거야! 그게 실제로 가능하냐고? 앞서 예를 든 케이스가 실제로 내가 함께 일했던 실무자가 만들었던 사례라는 것.
📍 ‘리더와 경영진’은 언제나 ‘숫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해.

4. 예산 결과물로 예산을 빛내주기
자, 그럼 이제 실제 예산을 받게 되었어.
앞서 만든 작은 결과물로 예측치도 만들었고, 목표 성과도 숫자로 잡았어. 그리고 알뜰살뜰 잘 써서 목표도 달성했어. 그럼 끝일까? 그렇게 되면 다음 예산을 얻기 위한 똑같은 과정이 계속될 거야. 예산을 쓰고 그대로 끝나면 안 돼. 그럼 뭘 해야 할까?
얼마의 예산을 써서, 얼마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내부에 결과를 남겨야 해. 예산과 숫자가 크지 않아서 여기저기 이야기하기 민망하다고? 그럼 최소한 선임, 파트장, 팀장 등 보고 라인에 있는 분들에게라도 꼭 전하도록 해!
그래야만 마린이가 예산을 세심하게 잘 쓸 줄 아는구나, 결과를 끝까지 챙길 줄 아는구나, 결과가 좋은 경우 쓰는 만큼 효과가 나오는구나를 알게 돼. 그러면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더 큰 예산을 요청하면 설득할 가능성이 더 커지지. 가만히 있어도 알게 되지 않냐고? 말하지 않으면 몰라. 내 일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거든. 그리고 예산이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 않아. 30만 원이라도, 3천만 원이라도 그걸 써서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해.
그렇게 예산이라는 아이를 빛내주는 거지. 아쉽게도 성과가 부족했다면? 그래도 괜찮아.
‘A라는 고민을 해서, 목표 B를 향해 애써 달렸는데 아쉽게도 C만큼의 미달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배운 D를 적용해 다음에 꼭 달성하겠다.’ 이렇게만 보고해도 마린이는 잠재력 높은 일잘러가 될 수 있을거야.
가만히 있지마. 숨기려 하지마. 고민하고 실행하고 그 과정을 공유해.
물론 과정 하나하나를 다 꺼내라는 말이 아냐. 윗분들은 바쁘시니까. 간단하게 한눈에 보기 좋게 요약하는 것! 예쁘게 만드는 것에 너무 많은 애를 쓰지 말고. 부풀려 보이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경험치가 있으셔서 윗분들은 한눈에 보면 알거든.
📍 예산을 쓰는 일의 끝은 ‘결과 정리’와 ‘의미 만들기’라는 것을 기억해.
아티클 요약
1. 예산의 비밀
먼저 마케터부터 예산에 포함된다. 내가 일하는 ‘시간’이 예산이다!
> 무기의 질문 : 내 시간은 ‘가치’를 만들고 있을까?
2. 예산의 함정
예산을 쓰면 그보다 최소 배 이상은 더 벌어야 한다.
> 무기의 질문 : 내가 ‘예산’을 쓰면 그걸로 ‘얼마’를 더 벌 수 있을까?
3 예산의 쓸모
예산으로 어떤 ‘성과’를 만들지 ‘숫자’로 표현되어야 해.
> 무기의 질문 : 내 성과를 어떻게 ‘숫자’로 만들 수 있을까?
4 예산의 결과물
예산을 쓰는 일의 끝은 ‘결과 정리’와 ‘의미 만들기’야.
> 무기의 질문 : 이번에 어떤 걸 성취하고, 어떤 걸 알게 되었을까?
오늘 들려준 예산 고민 무물, 어땠어? 🤔
전해주는 이야기를 잘 담아놓으면 적은 예산을 획득하고, 사용하고, 보고하는 과정까지 더 수월해질 거야.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예산을 담을 수 있는 경험치도 쌓이게 될 거고. 그동안 어려웠던 과정, 지금 겪고 있는 상황 모두 이해해. 나도 마린이일 때부터, 리더일 때까지 같은 마음이었거든. 마음이 답답해도 회사는 인풋과 아웃풋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줘. 그걸 알고 설득하면 원하는 것을 더 잘 얻을 수 있을 거야. 고민이 있다면 내 채널을 찾아와줘. 그 안에서 힌트를 얻어갈 수 있을 거야.
글 디렉터 초인 (인스타, 브런치, 링크드인)
CJ ENM, 월트디즈니, GFFG(노티드)까지 미디어, 캐릭터, F&B로 커리어를 쌓은 16년 차 마케팅 디렉터 초인이라고 해. <마케터의 무기들>이란 책도 썼지. 지금은 무기 연구소 <초인 마케팅랩>에서 브랜드와 비즈니스의 성장 무기를 만들고 있어. 마케터의 성장을 만들고 싶다면 놀러와!
발행일 25.03.20